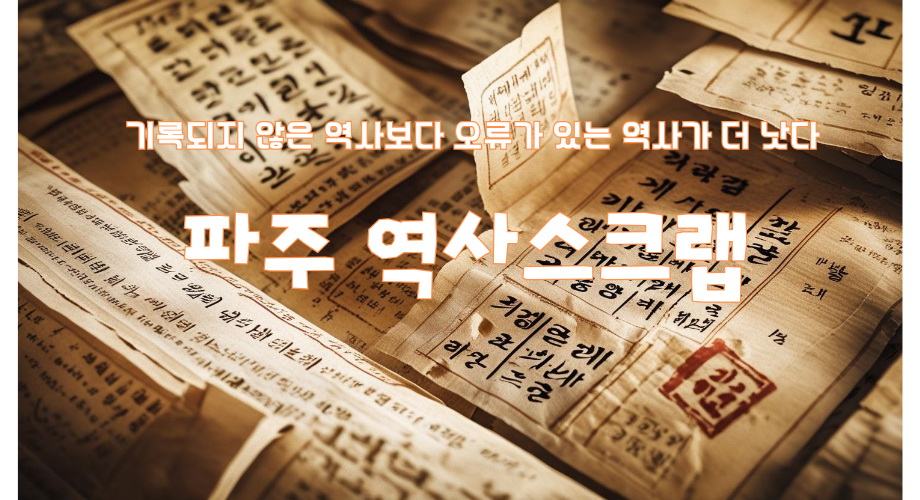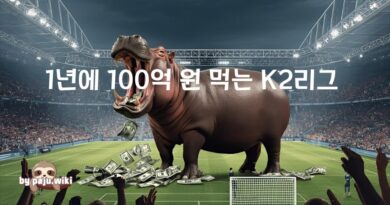일제 강점기 전쟁 관련 성금 신문기사
이 신문 기사는 일제강점기인 1938년2월22일 조선신문에서 당시 파주군(坡州郡)에서 진행된 전쟁 관련 성금 모금 활동을 보도하고 있다.
중일전쟁(1937년 시작) 수행을 위한 군사비 조달이 목적이었다. 일제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조선 전역에서 강제적 성금 모금을 실시했다.
AD 나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나의 즐거운 몸을 만든다
모금 대상은 파주군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주요 모금 주체로 나타난다. 당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를 통해 조직적으로 성금을 거둬들였다.
신문기사에는 학교별로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금액을 집계하고 각 학교명과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금의 성격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기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을 띤 수탈이었다. 일제는 애국심을 강요하며 조선인들에게 전쟁 협력을 강요했고, 성금 모금은 그 수단 중 하나였다.
번역 내용
坡州郡(파주군)의 헌금(献金)
【파주】 파주군 와석(臥石)보통학교 5학년생 이강규(李康揆) 군과 동생인 2학년 이강환(李康煥) 군(둘 다 성동리 거주)은 지난 12일 등교하여 교장에게 형제가 매일 각각 1전씩 받은 용돈과 지난 4, 5년간 저축해 온 세뱃돈을 합쳐 모은 돈 5원을 꺼내, “학교 내 애국저금에 보태주십시오”라며 간곡히 부탁하여 교장은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격하며 수령하였다고 한다.
파주군 와석보통학교 소년단에서는 이전부터 틈틈이 토끼를 사육해왔는데, 이번에 새끼를 낳아 그중 7~8마리가 순조롭게 성장하여 약 10원의 시가에 달하게 되자, 이를 매각하여 국방헌금으로 헌납하기로 20일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매각 방법을 담임 교사와 상담 중이라고 한다.
쇼와 12년(1937년) 10월, 애국부인회 광탄면 분구장 임금화(林金和)는 고치 부스러기를 모아 명주 조끼 10벌을 제작하였다. 그녀는 “매우 변변찮은 물건입니다만, 오직 황군(皇軍)의 충용무쌍한 활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작은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이 추운 시기에 전지(戰地)에서 싸우시는 병사분들을 위해 쓰인다면 다행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북지(北支, 북중국) 황군의 용사에게 위문품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했다.
파주군 임진(臨津)보통학교(교장 쿠라나가/倉永)에서는 작년 12월 21일부터 학생들의 저금 독려를 위해 각 교실에 저금함을 비치하였는데, 지난 15일에 개봉한 결과 총 50원 82전에 달하여 이를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였다.
파주군 내 각 보통학교에서는 애국일(8일)마다 국방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지난 8일 각 학교별 헌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임진보통학교: 4원 52전
- 월롱(月籠)보통학교: 2원 74전
- 심학(尋鶴)보통학교: 2원 43전
- 아동(衙洞)보통학교: 2원 2전
- 청석(靑石)보통학교: 1원 92전
- 영태(永泰)보통학교: 1원 62전
- 봉상(鳳翔)보통학교: 1원 41전
- 금촌(金村)보통학교: 1원 24전
- 적성(積城)보통학교: 87전
- 교하(交河)공립보통학교: 1원 6전
- 삭녕(朔寧)공립보통학교: 1원 50전
- 기타 3개교: 86전
뜨거운 정성
파주군 각지에서 답지하는 휼병금
【파주】 파주군 군내면(郡內面)의 이래 각지에서 애국적 정성이 담긴 휼병금(恤兵金)을 헌납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각각 ‘금’으로 표시)
군내면(郡內面) 공립보통학교 직원 및 아동
- 2월 8일 애국일에 직원 및 아동이 모은 1원 12전을 황군 위문금으로 헌납.
주내면(州內面) 기관 및 유지
- 주내면사무소 직원 일동: 8원
- 주내 금융조합 직원 일동: 5원
- 봉서(奉棲)리 구장 나카무라(中村) 씨 외 6명: 3원
- 연풍(延豊)리 구장 이시야마(石山) 씨 외 5명: 2원 80전
- 파주리 구장 사사키(佐々木) 씨 외 6명: 2원 50전
- 부곡(釜谷)리 구장 씨 외 1명: 1원
- 주내 경찰관주재소 순사 부장 외 2명: 3원 50전
- 보통학교 교원 7명: 5원 50전
- 학교 고용원 1명: 30전
- 금융조합 고용원 2명: 1원
주내면민의 애국저금
- 지난 8일 애국일에 주내면민이 헌납한 저금액은 총 78원 31전.
주내면의 애국기 ‘건강’호 헌납금 잔금
- 주내면에서는 애국기 ‘건강’호 구입을 위해 헌납 운동을 벌여 이미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답지하는 성금은 그칠 줄을 몰라 지난 19일까지 다음과 같이 38원 76전이 추가로 모금되어, 이를 전액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였다.
- 봉서리 스가(菅)씨 외 29명: 11원 5전
- 부곡리 곤도(近藤)씨 외 6명: 2원 70전
- 연풍리 아리타(有田)씨 외 13명: 5원 41전
- 파주리 곤도(近藤)씨 외 15명: 8원 60전
- 주내금융조합 직원 외 2명: 2원
- 주내면사무소 직원 및 고용원: 9원
기타
- 1937년 12월 26일, 파주군 군내공립보통학교 교원 및 생도 일동이 애국일에 모은 12원을 국방헌금으로, 학생 용품 대금으로 얻은 이익금 18원 12전을 장병 위문금으로 헌납하였다.
- 파주군 군내공립보통학교 측에서는 금번 소작료 징수 시기를 이용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한 푼 두 푼의 저금을 장려하여 그 돈을 모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12월 말까지 모금된 40원 50전을 헌납하였다.
- 1937년 11월 20일경부터 2개월간, 파주군 교하면(交河面) 당하리(堂下里)의 오카모토(岡本) 씨는 부인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짚신 1,000켤레를 만들어, 이를 매각한 대금 65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였다. 또한, 오카모토 씨는 11월 한 달간 금주, 금연으로 절약한 10원도 헌납하였다.
진동면(津東面)의 휼병금품
파주 진동면(津東面) 지역의 휼병금(군사 원조 성금) 헌납자 명단입니다.
- 진동흥산회(振東興産會) 외 18인: 금 50원
- 동리(洞里) 진흥회원 외 21인: 금 30원
- 상하리(上下里) 동(洞) 진흥회원 권헌(權憲) 외 16인: 금 13원
- 산상리(山上里) 동(洞) 진흥회원 정환욱(鄭煥郁) 외 6인: 금 5원
- 이발산(里鉢山) 동(洞) 진흥회원 한관석(韓寬錫) 외 12인: 금 7원
- 삼거동(三巨洞) 진흥회원 이종선(李鍾銑) 외 2인: 금 3원
- 갈현동(葛峴洞) 진흥회원 박기원(朴基元) 외 2인: 금 2원
- 고읍리(高邑里) 노약남녀 동(洞) 진흥회원 일동: 금 20원, 마른 무 1관 200문(匁)
[이하 단체 및 개인별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헌납자 명단]
- 해외리(海外里) 동진흥회 외 18인
- 창동리(倉洞里) 동진흥회 외 12인
- 공릉리(貢陵里) 동진흥회 외 15인
- 상촌동리(上村洞里) 촌(村)동진흥회원 마명명(馬命命) 외 28인
- 팔문리(八門里) 조광규(趙光奎) 외 38인
- 대촌동리(大村洞里) 대촌(大村)동진흥회원 차계명(車啓明) 외 28인
- 대포리(大浦里) 촌(村)동진흥회원 차문택(車文澤) 외 18인
- 파주동(坡州洞) 진흥회 이문구(李文丘) 외 18인
- 파주읍(坡州邑) 선로면(船路面) 앞 대동리(大洞里) 동(洞)진흥회 김윤택(金允澤) 외 18인
- 성동리(城洞里) 대촌(大村)동진흥회 김성견(金聖見) 외 12인
- 파주읍(坡州邑) 촌(村)진흥회 김영후(金永厚) 외 21인
- 희촌동(喜村洞) 진흥회 김영후(金永厚) 외 12인
- 희촌동(喜村洞) 진흥회 우영후(禹永厚) 외 12인
- 희촌동(喜村洞) 진흥회원 김봉갑(金鳳甲) 외 25인
- 당현동(堂峴洞) 진흥회원 이범득(李範得) 외 12인
- 당현동(當峴洞) 진흥회원 신백균(申伯均) 외 14인
- 법흥(法興) 송현동(松峴洞) 진흥회원 이근영(李根永) 외 12인
- 송현동(松峴洞) 동진흥회원 김봉영(金奉永) 외 12인
- 송현동(松峴洞) 동진흥회원 김태윤(金泰潤) 외 8인
- 금릉산(金陵山) 동진흥회 외 38인
- 상변산동(上邊山洞), 칠등산동(漆登山洞) 진흥회 김재관(金在寬) 외 21인
- 응견동(鷹見洞) 외 21인
위 내용은 인공지능이 번역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조선신문 소개
민간 상업지에서 정치 신문으로, 조선신문의 두 얼굴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신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던 시절, 조선신문은 인천에서 ‘민간’과 ‘상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독특하게 출발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와 선을 그으며 스스로를 ‘민의를 대표하는 민간지’이자, 조선과 만주의 경제 정보를 다루는 유일한 상업지로 내세웠습니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신문의 논조는 실질적으로 인천에 기반을 둔 일본인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일본 정부(영사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민간’을 표방했지만 일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신문의 성격은 본사를 서울(경성)로 이전하면서 결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인천 시절 상업 정보에 집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정치적 기사의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결국 ‘상업지’라는 초기의 정체성은 옅어지고 정치적 색채가 짙은 신문으로 탈바꿈하며 시대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처럼 조선신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언론이 처한 복잡한 현실과 생존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